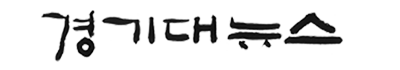앞선 지면에서 커피가 시작된 배경과 더불어 한국인의 남다른 커피 사랑에 대해 알아봤다. 이어서 본지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열리는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 ‘요즘 커피’를 오아란 학예연구사의 설명과 더불어 직접 방문해 현장을 담아봤다.

나는 당연히 ‘얼죽아’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원두를 내리고 있을 것 같은 한적한 카페의 분위기가 펼쳐졌다. 본격적인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평소 카페를 자주 찾는 기자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본 전시는 ‘오늘도, 커피’라는 프롤로그로 시작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신과 어울리는 커피를 찾는 ‘커피 취향 검사’다. 짧은 취향 검사를 통해 △믹스 커피 △라떼 △아메리카노 중 자신과 맞는 커피를 추천받게 되며, 추천받은 커피에 맞는 카드를 받게 된다. 카드에는 추천된 커피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전시 리플릿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소소한 재미를 통해 전시회에 대한 기대를 품고 들어갈 수 있었다.

커피도 우리 민족이었어
전시의 1부 ‘일상×커피’에서는 △1897년 개항기 △일제강점기 △1970~80년대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며 외래 음료였던 커피가 한국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섹션은 서양인이 조선에 거주하는 다른 서양인에게 커피를 대접받은 일화를 기록한 ‘조선풍물지’,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오얏꽃무늬 커피잔’ 등을 통해 당시 커피 문화의 시작을 엿볼 수 있었다. 해당 섹션에서 알 수 있 듯이 처음 커피는 △선교 △무역 △외교 등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커피 상을 보여준다. ‘대경성안내지도’를 통해 당시 커피가 주로 서양식 호텔에서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윤홍주의 다과점’과 같은 다방들이 생겨났으며 지도를 통해 서울 명동과 소공동 일대에 다방들이 많이 모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70~80년대에는 ‘맥스웰하우스 인스턴트 커피’와 ‘맥심 믹스 커피’의 초기 모습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한 커피가 대중화됐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다방은 학생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직장인, 수험생들의 필수 공간이었고 1990년대 ‘레쓰비’ 출시 이후에는 어디서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를 통해 커피가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직도 은은하게 남아있는 커피 향
전시 2부는 ‘연결∞커피’로 커피를 통해 생겨난 추억, 인연을 다룬다. 첫 번째 섹션은 ‘커피 한잔하는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커피 한잔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생겨남을 보여준다. △다방 사진 △아이돌 생일 카페 굿즈 △삐삐 △군복 등 어쩌면 커피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전시돼 있다. 이는 커피가 △만남과 헤어짐 △인간관계 △취미 등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이러한 전시품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고 읽어가면서 잠시 전시품 앞에 멈춰 섰다. 어쩌면 커피와 자신과의 추억에 빠져든 게 아닐까. 다음 섹션은 ‘우리가 커피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원인을 설명한다. 이 섹션은 한국인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 네 사람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으로 구성됐다. 커피가 필요한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맛 △멋 △정 △여유를 찾는 것은 너무 사치였을까?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저 카페인을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커피를 찾으며 이를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시회는 ‘그래도! 커피’ 에필로그로 끝이 난다. 우리가 진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잠을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와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 이유’,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스티커 설문을 통해 전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기자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였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여운을 가지고 전시장을 떠났다.
한 잔의 커피를 내리는 데 필요한 원두는 단 20g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일 여러 잔의 커피를 즐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이 차지하는 무게는 얼마나 될까? 가볍지도,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은 어쩌면 그 적당한 무게감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글·사진 김세은 기자 Ι seeun2281@kyonggi.ac.k
- 관련기사
-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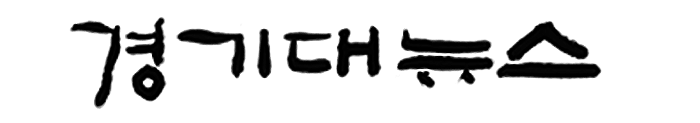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