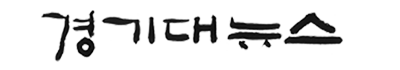물가 지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시민들의 장바구니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지기만 한다. 과자 양은 줄고 외식비는 뛰는 요즘, 우리가 느끼는 ‘진짜 물가’는 무엇일까. 이에 본지는 체감 물가 상승의 실체에 대해 알아봤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수치상으로 안정돼 보이지만, 시민들이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느껴지는 체감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달걀 △라면 △과자 △ 커피 등 자주 소비되는 서민 식품의 가격은 5~10%가량 올랐고, 일부 외식 품목은 15% 가까이 인상됐다. 이는 평균 물가와 실생활에서의 체감 물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하는 ‘전 품목 평균’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일상 소비 품목 평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00여 개의 품목을 종합해 산출 하지만 실제 가계지출은 그중 소수 품목에 집중된다. 즉, 매일 장바구니에 담기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전체 물가가 낮더라도 가계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격 비탄 력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도 반복 구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을 체감하면서도 그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정체 현상’까지 겹치며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표가 안정돼도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이 겹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아주 높은 상황인 것이다.
줄었는데요, 그대로입니다
요즘 따라 즐겨 먹던 과자가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내진 않는가? 가격은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는데, 유독 금세 다 먹은 느낌이 든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전형적인 사례로, 가격은 그대로 두되 제품의 △양 △크기 △품질을 은근히 줄이는 방식의 물가 인상이다. △봉지 과자 속 과자의 양은 줄고 △커피믹스 분말은 적어지고 △햄버거의 고기 패티는 얇아지는 등 품질은 하락했지만 포장과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자각보다 ‘이상하다’는 불편이 먼저 체감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조사가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하는 전략이다. 특히 고정된 단가를 유지해야 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유통 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비가격적 인상’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은밀한 조정이 소비자들에게 ‘속았다’는 감정을 남긴다는 것이다.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닌데 만족감은 줄고, 실질 구매력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포장과 용량 표기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점차 신뢰를 잃고 기업에 대한 피로 감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가장 얄밉고 교묘한 형태의 물가 상승일지도 모른다.
‘체감 물가’ 잡는 정책은 따로 있다
이러한 체감 물가 상승은 단순한 시장 흐름을 넘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TF’를 재가동해 △달걀 △우유 △라면 △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에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은폐형 물가 인상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호와 투명한 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서민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필수 생필품의 수급 안정 △공공요금 조정 △유통 구조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결국 물가 안정의 핵심은 숫자 그 자체보다 소비자들의 체감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통계에 완전히 담기지 않는다. 이제는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닌,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 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가 국민에게 ‘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유정 수습기자 Ι 202510140@kyonggi.ac.kr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