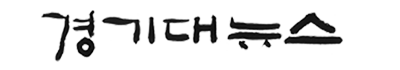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정이사체제 전환을 앞두고 학내에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 추천권을 놓고 평의회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특정이사 추천 반대 성명서까지 나왔다. 7일에는 한화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내에 R&D센터와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를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경기대학교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 지난 2004년 12월 손종국 당시 총장이 교수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교비 49억 원을 전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전후로 로스쿨 유치, 한의대설립 등 경기대학교의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후 경기학원의 소유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동국대학교, 인제대학교 등에서 경기학원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교명변경 등의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은 반발했다. 그 시기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학교를 인수, 도립대학교를 전환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되었다.
2011년 사학분쟁위원회에서 경기학원의 정이사 체제를 논의하다 2012년에야 정이사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구 재단이사 3명의 반대 속에 교육부 파견 관선이사인 박승철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혼란은 계속되었다. 2015년 3월 손희자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재단이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내분으로 2020년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손 전 총장은 학내 반발에 부딪혀 2021년 6월 “학교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갈등으로 총장선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재파견,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0년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먼저,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바로 서야 경기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정이사체제가 되고, 이사들 간의 화합만으로 학교발전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등록금 수입만으로 대학을 정상 운영하기에는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규제로 인해 학교 수입은 고정되었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대학입학자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획기적 변화 없이 경기대학교는 명성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내 재벌 순위 7위인 한화의 경기대학교 투자는 갑작스러웠지만 구성원들의 기대를 받기 충분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구속 중인 손종국 전 총장의 딸인 손수지 대표가 이사회 참여를 희망하면서 한화와 물밑 논의를 했다고 한다.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설립 계획도 어설펐지만, 대학본부나 이사회와도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표였다. 설립자의 손녀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공간을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큰 오산이다. 다만 새로운 논의를 촉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화의 관심은 학교 운영 참여가 아닌 경기대학교가 지난 토지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광교의 지하철 역 앞에 넓은 야산과 경기드림타워(기숙사) 앞 잔디밭, 그 옆은 넓은 주차장 등에 대해서 한화는 사용의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와 교육연구시설, 향후 R&D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모두 합치면 1만 5,000평이 넘는 토지이다.
경기대 구성원들은 마냥 기쁜 일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기피시설이다. 전기파와 엄청난 소음 등의 위험이 학생들의 생활공간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기드림타워 바로 앞 잔디밭을 없애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를 벌이면 학교는 공사판이 된다. R&D센터까지 건립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겪는다. 어설픈 기획서 한 장에 경기대학교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만약 한화가 경기대학교의 노른자 땅을 차지한다면 향후 경기대학교에 장기 투자할 건실한 후원자를 사라지게 만든다.
우리는 경기대학교에 1년에 최소 300억 원 이상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튼실한, 사학재단을 원한다. 구성원들이 한화라는 이름에 끌렸던 것도 국내 7위의 그룹이라면 연간 500억 정도는 학교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단지 땅만 이용한다면, 한화는 30~40년간 싼값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경기대학교는 발전의 기회를 날리게 된다. 병원을 갖고 있는 지역 대학들도 괜찮다. 하지만 연간 3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함께 ‘경기대학교’라는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대학교의 이름을 지키는 것은 학생과 동문,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만약 대기업이나 지역사학이 힘들다면, 도립대학교 혹은 국립대학교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 시비 875억 원, 2023년 476억 원을 서울시립대에 지원했다. 우리와 비슷한 사학분쟁을 겪었던 인천대학교는 시립대학교를 거쳐, 국립대로 바뀌면서 연간 900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대의 등록금은 우리의 절반수준 232만 원인데, 1인당 교육비는 1,959만 원에 달한다.
오는 11월 8일이면 경기대학교는 건학 77주년을 맞는다. 고(故) 손상교 선생이 77년 전 육영사업을 한 취지는 후손들의 영화가 아니라, 인재육성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지 설립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에 정이사 체제 전환이후 ‘손씨일가’는 학교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법인, 단체를 찾아서 학교 성장을 위임해야 한다. 대학은 더 이상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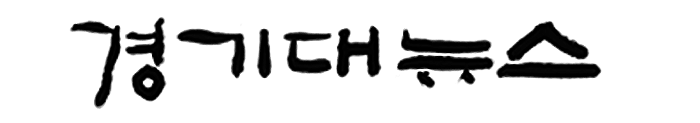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