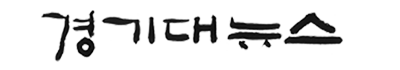기자의 집에는 고양이 ‘희니’가 있다. 희니는 어머니의 회사 사무실에 들락거리던 고양이로, 8년 전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됐다. 우리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희니의 잔뜩 겁에 질린 눈과 마주쳤을 때 기자는 이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몇 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자라난 희니는 사람에게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탓에 애교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친해지기 위해 간식을 주거나 놀아줘도 희니는 다가오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부끄럽게도 그런 희니가 밉기도 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작은 털 뭉치에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희니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희니에게도 똑같이 샘솟았다. 그렇게 언젠간 희니도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며 참 미련하게도 오랜 짝사랑을 했다.
기자의 집에는 고양이 ‘희니’가 있다. 희니는 어머니의 회사 사무실에 들락거리던 고양이로, 8년 전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됐다. 우리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희니의 잔뜩 겁에 질린 눈과 마주쳤을 때 기자는 이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몇 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자라난 희니는 사람에게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탓에 애교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친해지기 위해 간식을 주거나 놀아줘도 희니는 다가오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부끄럽게도 그런 희니가 밉기도 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작은 털 뭉치에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희니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희니에게도 똑같이 샘솟았다. 그렇게 언젠간 희니도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며 참 미련하게도 오랜 짝사랑을 했다.
그 사랑이 보답받은 건 기자가 고등학생일 적 겨울밤, 서서히 찬바람이 코끝을 건드릴 때였다. 어느 때와 다름 없이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몸을 뉘니 바로 잠이 왔다. 잠이 들려는 순간 누군가의 무게가 침대에 실리는 게 느껴졌다. 그건 희니였다. 희니는 침대 위를 빙빙 돌던 끝에 멈추더니 기자의 다리에 기대 누웠다. 희니의 따듯한 온도는 이불 너머 기자의 몸까지 전해졌다. 창문 틈 사이로 몰래 들어오던 차가운 바람은 곧 희니의 따뜻함에 막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희니로 인해 어느 밤보다도 따뜻했다.
기자에게 첫 만남은 항상 어렵다. 그중에서도 신문사에서의 첫 만남은 가장 힘겨웠다. 희니와의 첫 만남처럼 말이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을 처음에는 희니처럼 기자를 불편해할까 싶어 제대로 못 건넸던 기억이 있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 모두를 편하게 대하는 지금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문사 동기들과 이처럼 끈끈해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과 사랑을 쌓고 보답했을까. 1년 동안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서로에게 기대 따뜻함을 나누며 위로한 덕분에 지금이 온 것일 테다. 3월, 기자는 다시 첫 만남을 겪어야 한다. 이 첫 만남은 △최악일 수도 △어려울 수도 △힘겨울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긴장된다. 그래도 기자는 다시 한번 짝사랑을 해보려고 한다. 이 사랑이 언
젠가 또다시 보답받으리라 믿으면서.
글·사진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




 기자의 집에는 고양이 ‘희니’가 있다. 희니는 어머니의 회사 사무실에 들락거리던 고양이로, 8년 전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됐다. 우리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희니의 잔뜩 겁에 질린 눈과 마주쳤을 때 기자는 이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몇 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자라난 희니는 사람에게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탓에 애교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친해지기 위해 간식을 주거나 놀아줘도 희니는 다가오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부끄럽게도 그런 희니가 밉기도 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작은 털 뭉치에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희니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희니에게도 똑같이 샘솟았다. 그렇게 언젠간 희니도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며 참 미련하게도 오랜 짝사랑을 했다.
기자의 집에는 고양이 ‘희니’가 있다. 희니는 어머니의 회사 사무실에 들락거리던 고양이로, 8년 전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됐다. 우리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희니의 잔뜩 겁에 질린 눈과 마주쳤을 때 기자는 이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몇 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자라난 희니는 사람에게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탓에 애교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친해지기 위해 간식을 주거나 놀아줘도 희니는 다가오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부끄럽게도 그런 희니가 밉기도 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작은 털 뭉치에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희니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희니에게도 똑같이 샘솟았다. 그렇게 언젠간 희니도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며 참 미련하게도 오랜 짝사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