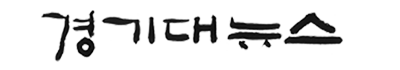지난 2022년 본지의 수습기자로 들어와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1072호를 시작으로 이번 1110호까지 총 39호의 신문을 발행했고 그중 21개 신문의 제작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솔직히 취임사를 작성한 당시엔 활동의 마지막이 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그러나 막상 퇴임사를 적는 순간이 오니 생각보다도 덤덤한 마음이 크다. 그저 마지막인 만큼 퇴임사라는 취지에 걸맞을진 모르겠지만 진솔한 얘기를 남기고 싶을 뿐이다.
편집국장의 삶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처음 자리에 올랐을 때는 그저 업무적으로 빈틈없이 좋은 신문을 내는 국장이 된다면, 그것이 편집국장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지금까지의 본지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보였던 것일 테다. 하지만 격주에 한 번씩 신문을 내는 건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내부 운영이었다. 1년 반 동안 신문사를 하며 가장 고됐던 업무는 국원을 살피고 스스로의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본지를 운영하며 제 미숙함으로 떠나보낸 이도, 지금의 기자처럼 활동의 마지막이 다가와 떠나간 이들까지. 하나둘 멀어지는 걸 보며 국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사실 그것보다도 이런 본인이 밉지는 않을까, 이 아이도 나가는 건 아닐까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게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그러던 중 “국장은 힘들어도 티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활동 초기엔 국장이 흔들리고 힘들면 신문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후 힘듦을 보일 때면 자괴감이 들었고 어떻게든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도 강인한 편은 아니었던지라 현재 국원들에게 국장으로서의 든든함이 아닌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할 뿐이다. 결국 긴활동의 끝자락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막연히 스스로가 좋은 국장이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맴돈다.
그랬던 만큼 국장이 된 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린 후배들에게 운영진이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나가게 돼 죄책감이 든다. 떠나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고 걱정되지 않을 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 활동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후배들에게 운영진이라는 무게를 넘겨주게 된 사실에 스스로가 참 밉다. 이번 호를 기점으로 본지 편집국장으로의 활동은 끝이 나지만 앞으로 후배들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돼주는 것이 퇴임하는 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신문사가 과연 어떤 이미지로 비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전부 떠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기 편집국장이 만들, 본지의 국원들이 만들어 갈 앞으로의 경기대신문은 이전과 다를 테니 말이다.
김봄이 편집국장 Ι qq4745q@kyonggi.ac.kr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