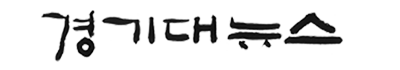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병원, 그 중에서도 별관에 있는 ‘6호실’에는 5명의 환자가 있다. 집안이 좋은 환자는 단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소시민들이다. 이들은 모두 정신병자로, △피해망상증 △지적장애 △정신분열증 등 각기 다른 병을 가져 정신병원에 수감된 상태다. 이중 유일한 귀족 출신인 ‘이반 그로모프’는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본래 정의감이 투철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건실하고 부유한 사내였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결국 그와 어머니는 무일푼 신세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쥐꼬리만한 액수를 받는 등의 처량한 신세가 됐음에도 그는 항상 독서를 즐겼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며 호송길에 오르는 죄수들을 보게 된다. 이후 누군가 자신을 잡기 위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빠지게 된다.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발작까지 이르게 되자 결국 그는 6호실로 향하게 된다. 한편 6호실에 있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사, 라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조로운 일상에 권태에 빠지게 된다. 대신 그는 책 속의 세계를 탐닉하며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며 탄식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던 라긴은 6호실에서 그로모프를 만나며 철학적 논쟁을 즐기게 된다. 하지만 그 또한 미쳤다고 판단한 주변인들은 그를 6호실에 집어넣게 된다.
“당신은 고통을 무시한다지만, 아마 당신도 문틈에 손가락을 끼게 되면, 목청껏 큰소리로 비명을 질러댈 겁니다!”
『6호실』 中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인 <6호실>은 6호실에 갇힌 피해망상증 환자와 인간의 삶에 무관심한 의사 간의 논리적 대립을 주제로 한다. 약 1세기 전에 집필된 이 소설은 라긴을 통해 정신병동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감옥에서 무저항주의로 일관하던 당대의 사회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작가 특유의 사실적이고 섬세한 문체는 현실에 순응했던 군중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게 한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긴은 이를 관념적으로 정의한다. 물질적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병동에서의 생활과 바깥 생활이 동등하다고 여긴다. 다만 세월의 풍파를 겪은 그로모프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유기체란 자극에 반응하는 법이라며 고통에 비명 지르고,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삶이라고 외친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그들의 논쟁은 라긴이 맞은 비참한 최후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쩌면 작가는 6호실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사망한 라긴을 통해 내면의 세계에 도취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상으로의 도피는 답이 될 수 없으며 참을 수 없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박상준 기자 Ι qkrwnsdisjdj@kyonggi.ac.kr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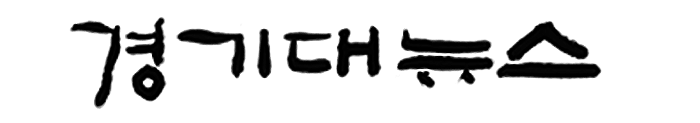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