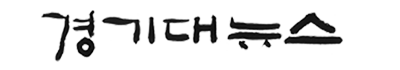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 과거에 왔던 밴드 붐, 사라지지 않고 또 왔네
올해 가요계는 ‘밴드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밴드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아이돌 중심의 기존 K-POP 음원차트에서 밴드 음악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밴드 붐’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밴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점점 더, 더, 더
밴드는 각종 악기로 록, 재즈 등 다양한 대중음악을 합주하는 악단을 뜻한다. 세간에서는 ‘밴드’라고 하면 주로 록 밴드를 떠올리지만 본래 초기 밴드는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연주하는 빅 밴드 형태였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렉 △베이스 △키보드 △드럼으로 이뤄진 록 밴드 구성은 ‘크리켓츠(Crickets)’라는 그룹이 최초로 시도했다. 크리켓츠가 시도한 4인 구성의 밴드 형태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 리버풀에서 탄생한 전설의 밴드, ‘비틀즈(Beatles)’가 결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전에는 없었던 발랄하고도 사랑스러운 음악으로 4인 구성의 밴드를 대중화시켰다. 그 후 1970년에는 윗세대에게 ‘밴드’ 그 자체이자 젊은 세대에게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친숙한 ‘퀸(Queen)’이 등장했다. 그들은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서 즐기는 무대 퍼포먼스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콜드플레이(ColdPlay)’, ‘마룬 5(Maroon 5)’ 등 전설적인 밴드가 등장하며 , 과 같은 명곡을 남겼다. 그들의 노래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과거 밴드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밴드의 기억들로 가득 채울래
우리나라의 밴드가 외국의 전설적인 밴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한국 밴드의 역사는 록 밴드의 태동기부터 영미권과 그 궤를 같이했다. 한국 밴드의 역사는 1960년대 ‘한국 록의 대부’라고 불리는 신중현이 최초의 록 밴드 ‘애드 포(Add 4)’를 결성하며 시작됐다. 1960년~1970년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사람들은 커피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다방’을 통해 각종 해외 음악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는 가요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1970년대에는 사회적 저항을 노래하는 밴드 음악들이 등장하면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밴드 연주가들이 마약, 도박 등 여러 사건 사고에 휩쓸리며 밴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이와 동시에 아이돌 음악이 가요계를 점령하면서 밴드를 향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다. 그러던 1980년, ‘무한궤도’와 같은 스타들을 발굴해 낸 ‘대학가요제’를 시작으로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1990년~2000년대에 들어 △자우림 △YB △버즈 등 수많은 밴드가 출현했다. 그들의 음악은 당시 한국을 뒤흔들었고 그들을 통해 모두가 밴드 음악을 사랑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버즈는 <겁쟁이>라는 곡으로 모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수상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나루토 OST <활주>를 부르는 등인기를 증명했다.
밴드 넌 그대로 그렇게 있어주면 돼
밴드는 하나의 비주류 문화로서 꾸준하게 사랑 받아왔지만 주류 문화에 속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의 플레이리스트에 하나쯤 있을 법한 대중적인 음악 장르가 됐다. 노래방 업계 TJ미디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래방 인기차트 100곡 중 20곡을 밴드 음악이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기존 아이돌 중심의 K-POP 음원차트에서 밴드 음악이 1위를 거머쥐며 모두가 즐기는 주류 문화로 변했기 때문이다. 밴드 음악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데이식스(DAY6)’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곡으로 역주행에 성공했으며 지난 9월 말 써클차트 중 디지털차트에서 곡 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더불어 요즘 밴드들은 형식적인 밴드 구성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예시로 밴드 ‘루시(LUCY)’는 클래식 악기인 바이올린이 하나의 세션으로 자리 잡아 기타 대신 멜로디를 주도한다. 또한 밴드 ‘카디(KARDI)’는 국악기인 거문고가 세션으로 존재해 색다른 선율과 분위기를 선사하며 밴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열풍에 부응하듯 댄스를 주 장르로 삼던 인기 아이돌 그룹들도 밴드 음악을 신곡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보이그룹 ‘라이즈(RIIZE)’는 베이스 소리를 앞세운 , 로 호평을 받았다. 또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지난 1월 팝 밴드 장르의 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로 국내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밴드 붐은 온다’는 말은 지금 현실이 됐다. 밴드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K-POP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제는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밴드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 가요계에 주축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김세은 기자 Ι seeun2281@kyonggi.ac.kr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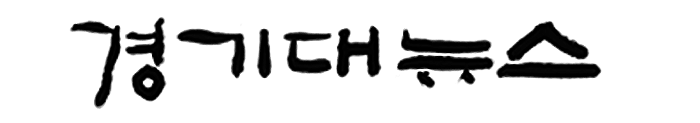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