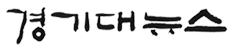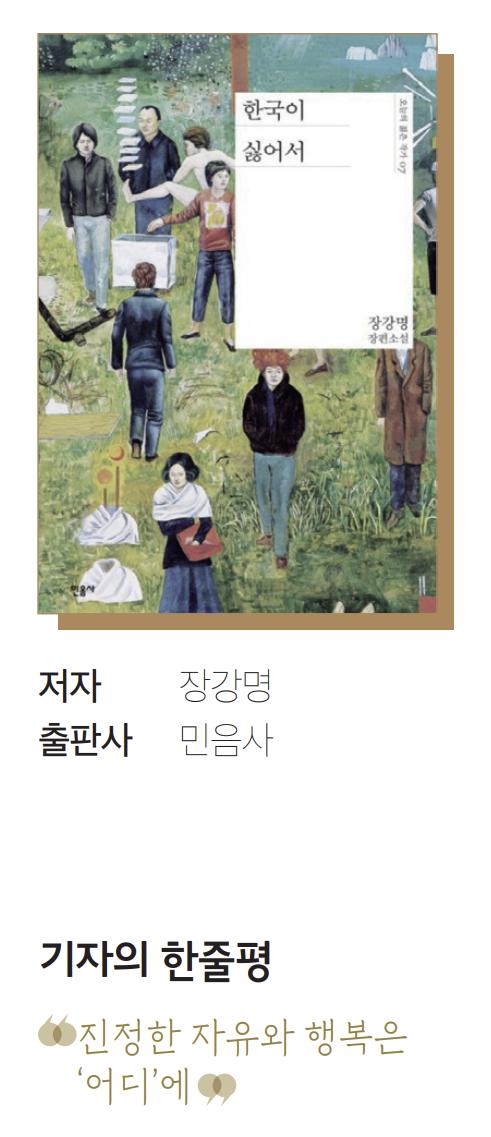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한 채 흘러가듯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전부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국이 싫어서>는 바로 주인공의 대담한 결심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5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취업난과 불평등에 지친 청년 세대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자리까지 올랐다. 인기에 힘입어 작년, 국내에서 동명의 독립영화로 제작돼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일본에서도 「ケナは韓国が嫌いで(계나는 한국이 싫어서)」로 상영되며 국경을 넘어선 공감을 끌어냈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는 학벌과 재력은 물론, 자아실현의 욕망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서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회사와 춥고 가난한 집을 오가며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호주로의 이민을 결심한다. 크고 작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대학원에 입학해 자리를 잡아가던 계나는 남자친구였던 ‘지명’으로부터 청혼에 가까운 고백을 받는다. 두 달 동안의 방학을 그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며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지명과의 삶에 흔들렸지만, 다시 호주를 선택한다. 첫 번째 출국은 ‘한국이 싫어서’ 떠난 도피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 출국은 ‘행복을 찾기 위한 도전’의 길이었던 것이다.
“자기 행복을 아끼다 못해 어디 깊은 곳에 꽁꽁 싸 놓지.
그리고 자기 행복이 아닌 남의 불행을 원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한국이 싫어서』 中
한국에 사는 20대로서 이야기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부단한 노력에도 달라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허망함이 마음에 와닿았다. 쥐가 사라지자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사라지자 개미가 나타나는 집의 풍경을 보며 ‘뭐가 바뀌긴 했는데 나아진 건 아니었어’라고 언급한다. 이 문장은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는 존재하고 남는 것은 좌절감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자가 계나의 상황이 됐더라도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작중 계나는 끊임없이 평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한국에 남은 가족들이 자신처럼 호주 이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이시스트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동생에게 신분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일이라며 지극히 계급적인 기준에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또한 한국과 호주를 비교하며 호주의 장점을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무의식적인 평가의 태도가 드러난다. 좁은 한국 사회는 서로를 비교하며 물질적 풍요만을 성공의 잣대로 삼는 구조 위에 서 있다. 더 위로, 더높이 올라가야만 한다는 강박은 한국을 싫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계나처럼 탈출하는 것도, 그 자리에 남아 버티는 것도 정답은 아닐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는 것이다.
정예은 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