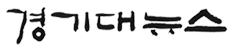새로운 라벨로 다시 태어나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겐남·테토남 △MBTI △퍼스널컬러 등 스스로를 규정하는 언어와 ‘밈(meme)’이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하나의 캐릭터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놀이와 맞물려 하나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MBTI 공식 저작권자인 ‘The Myers-Briggs Compan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이 MBTI 검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타입스(Types)에서 발표한 결과 ‘에겐·테토 테스트’ 참여자는 지난 5월 기준 누적 71만 이상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MZ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특정 특성이나 정체성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는 현상을 ‘라벨링’이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라벨링 문화는 과거부터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띠나 별자리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규정짓는 관습이 있어 태어난 해에 따라 12개의 띠로 나눠 사람의 기질을 설명했다. 별자리 역시 출생 시기와 연결해 성격적 특징이나 운명을 점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더불어 ‘A형은 소심해’, ‘AB형은 4차원’과 같이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정의해 말하던 경험도 익숙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복잡한 모습을 단순한 상징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MBTI나 퍼스널컬러 같은 라벨링 문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기준을 통해 사람을 유형화하는 시도는 세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반복돼 온 라벨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평범한 나에게 독특한 이름 하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라벨링,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문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것일까. 새 학기 첫날처럼 어색한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MBTI와 같은 주제는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와 같이 라벨링은 개인을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과 묶어 소속감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게 도와준다. 또한 라벨링은 일종의 별명처럼 활용되면서 놀이적 요소와 재미를 포함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소비된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라벨링은 일회성의 문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며 지속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라벨링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각 세대가 처한 심리적·사회적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MZ세대와 Z세대의 최대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질문이다. 실제 ‘트렌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문항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즉, 이러한 정체성 찾기 욕구가 라벨링 문화의 인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라벨링을 사용하면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려는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 발현돼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어든다. 이에 대해 대구대학교 박은아(심리학과) 교수는 “라벨링을 하면 상대를 오래 관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유형에 맞춰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이름 붙이기
하지만 늘 좋은 의미를 담은 라벨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꼰대’, ‘김치녀’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을 부정적으로 라벨링 해 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부정적인 라벨링은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감정을 직접 표출하기보다 집단에 투사해 공격하려는 욕구 해소 방식”이라며 “라벨링 해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 비난이 아니라 집단에 속하는 특성으로 범주화되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라벨링은 개인을 단순한 유형으로 묶어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놓칠 수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전 세계 70억 인구, 한국만 해도 5,200만 명이 있는데 이를 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단순히 분류해버리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며 “결국 사람을 섬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벨링 문화는 인간이 본래 가진 인지적 구두쇠 성향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다만 시대와 유행에 따라 새로운 라벨의 종류와 표현 방식은 계속 변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는 대상을 신속히 범주화하고 구분하려는 심리가 라벨링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은 라벨링 문화. 이는 놀이와 유희 요소로 쉽게 소비되지만 그 틀에 갇히는 순간 개인의 진짜 모습을 놓칠 수 있다. 고정된 라벨을 붙이는 문화에서 잠깐이나마 에서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아 수습기자 | yunna121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