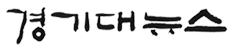측정 불가의 해결은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의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포괄 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임금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근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실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지자 운영되기 시작한 해당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업무 특성상 연 장 및 야간근로가 잦은 직종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현재 많은 사 업장에서 시행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며 ‘근로기준법 내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와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공약했다. 이에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8.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대가
포괄임금제는 꾸준히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합의된 임금만 지급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포괄임금 신고센터 운영 결과 695건이 신고됐으며, 근로감독 결과 9,321명에 대한 법 위반과 57억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무임금 노동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포괄임금제가 곧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불가피한 야근 및 주말 근무와 유연하고 비선형 적인 업무가 많아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IT·게임 업계 의 경우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IT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 88.1% 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지난 5월, 국내 게 임사 노동조합은 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 폐지,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NAVER) 노동조합 오세윤 위원장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근무 체제를 혁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 모두에게 불리한가?
하지만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와 관련해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가 증가한 현재에선 휴게시간과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또한 관련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조사 결과 대기업 52.5%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반대 이유로 ‘실근로시간 측정에 관한 노사 갈등 심화’를 꼽았다.
더불어 기업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파악을 위한 추가 비용을 우려한다. 지난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약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1.6%가 근로시간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을 근거로 포괄임금제 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약정된 시간외근로 시간에 비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포괄 임금제는 유리한 제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인 사업장에서 약정 근로시간 보다 실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약정 수당을 지급한 비율이 79.3% 에 달했다. 이광선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자체보다 본래 취지를 벗어난 악용이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약정의 명확성,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전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무임금, 장시간 근로의 관행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현재, 실근로시간 측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인 듯 보인다.
임서현 기자 Ι imseohyeon1827@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