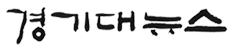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간 재이송이 빈번해지는 등 심각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응급실 뺑뺑이’, 병원과 정부의 분쟁으로 번져···
장기간 이어진 의료 파업과 의사 수 급감으로 인해 환자들이 응 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며 병원 간 재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 구급서 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구급차 재이송은 8,1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를 사유로 재이송된 사례는 1,661건으로 20.31%를 기록하며 응급의료인력 부족이 재이송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의료 파업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짐에 따라 응급의료 거부가 고의적인지 필연적인지에 대한 병원과 법원 사이 분쟁이 일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만 17세 A양이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며 머리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여러 병원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마지막 대구가톨릭병원의 무응 답에 A양은 결국 사망에 이르며 많은 사람의 충격을 자아냈다.
아니 정말 의료진이 없어요
해당 사건은 응급실 뺑뺑이로 10대가 사망에 이른 첫 사례인 만큼 당시 큰 화제를 몰았다. 이른바 ‘대구 뺑뺑이’ 사건으로 불리는 데,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구가톨릭병원을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하며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당시 대구가톨릭병원 측은 신경외과에 진료 가능한 의료진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덧붙여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했다”며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 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대구가톨릭병원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의료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의 전국 병원에서 응급실은 일차적 검사나 응급처치만 할 수 있을 뿐, 이후 수술·입원 등 최 종 치료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종 치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환자를 받으라는 얘기냐”며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병원에 시정명령과 6개월 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 우선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게 가능했다”며 “단순히 신경 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는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의료개혁의 딜레마 지속, 해결책은 어디에?
의정갈등 장기화 상황 속 연내 의료개혁 관련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가 4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대화 를 중단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한국의과 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정부·여당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올해 의대입시 절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증원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응급실 뺑뺑이’의 해결 방안은 무조건 적인 환자 수용이 아닌 적절한 치료 역량을 확보한 병원에 적기 이송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치료 발전 계획·필수 의료 대책에 따르면 응급실은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의 료계는 중증 환자의 최종 치료가 응급실의 역할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동시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만 담당 하는 곳이라 전하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국 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혜윰 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