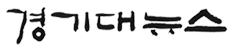난 패러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어디 출신? 미시시피' 이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뮤지컬 <시카고>의 넘버 ‘We Both Reached for the Gun’의 한 부분으로 여러 방송 등에서 패러디되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최근 뮤지컬 붐과 같은 유행에 편승한 패러디도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디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전반적 흐름, 등장인물의 말투 등을 모방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흉내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작품과 인물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개그맨 이창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빵송국’에서 <킹키부츠>를 높은 완성도로 패러디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영향으로 대중들은 원작 뮤지컬 자체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국내는 물론 해외 배우의 공연 영상까지 주목받았다. 이렇듯 패러디는 표현 방식을 넘어 원본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을 끌어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킹키부츠> △<웃는 남자> △<데스노트> 등을 패러디하는 빵송국의 ‘뮤지컬스타’ 콘텐츠는 재미를 넘어 실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깊은 분석과 디테일을 보여준다.
SNL 코리아, 자중해
패러디하면 풍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현 미디어계에서 ‘SNL 코리아(이하 SNL)’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SNL은 가벼운 콩트부터 정치 풍자까지 수위를 넘나드는 코미디를 콘셉트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SNL의 원조는 미국으로, 정치 및 사회 이슈를 가감 없이 풍자한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자신으로 분장한 배우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들의 풍자는 공영방송인만큼 여러 규제를 고려하지만 늘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든다. 국내 SNL도 이를 차용해 적극적인 사회 풍자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MZ세대의 특징을 풍자한 ‘MZ 오피스’는 대중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처럼 현 사회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재치 넘치는 풍자는 통쾌함을 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6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6
그러나 이러한 SNL의 패러디가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쿠팡플레이 SNL 시즌 6이 시작되며 △한강 작가 △뉴진스 멤버 하니 △드라마 정년이 등을 패러디했는데 이것이 지나친 희화화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를 패러디한 장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배우 지예은은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는데 이것이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를 조롱한 인종 차별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에는 배우 김아영이 한강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따라 했는데 나긋한 말투에 자세를 움츠리고 실눈을 뜨는 등 외적인 면을 과장해서 표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롱하는 느낌이 든다”, “외모 비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패러디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 없다며 그저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반해 그저 특징을 잘 살려 흉내 냈을 뿐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거세게 대립하며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패러디, 널 어쩌면 좋니
이렇듯 SNL의 패러디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상 OTT를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네티즌들의 민원은 방심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며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러한 상황 속 패러디 자체에 대한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특정 사람에 대한 조롱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에서 이뤄진 창의적 접근이라며 OTT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의 풍자는 공영방송에서 접하기 힘든 분위기로 주로 OTT나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이뤄진다. 작년 6월부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OTT가 규제 없이 자유로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OTT 프로그램인 SNL이 수위 및 내용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패러디는 풍자와 조롱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는 현재 뜨거운 논쟁거리다. 모두가 쉽게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미디어 내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해져야 하진 않을까.
이한슬 수습기자 Ι lhs522701@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