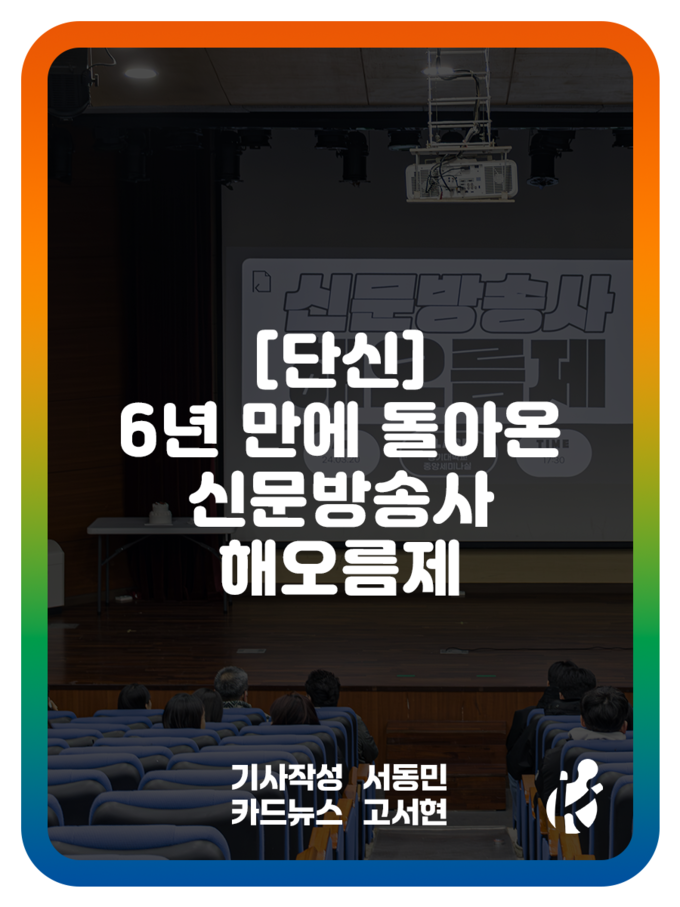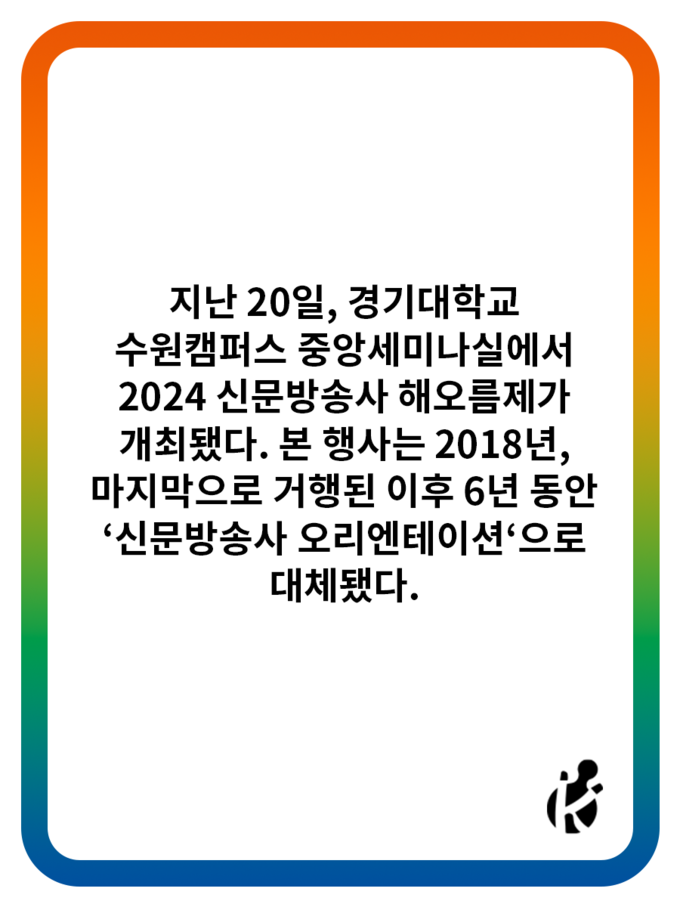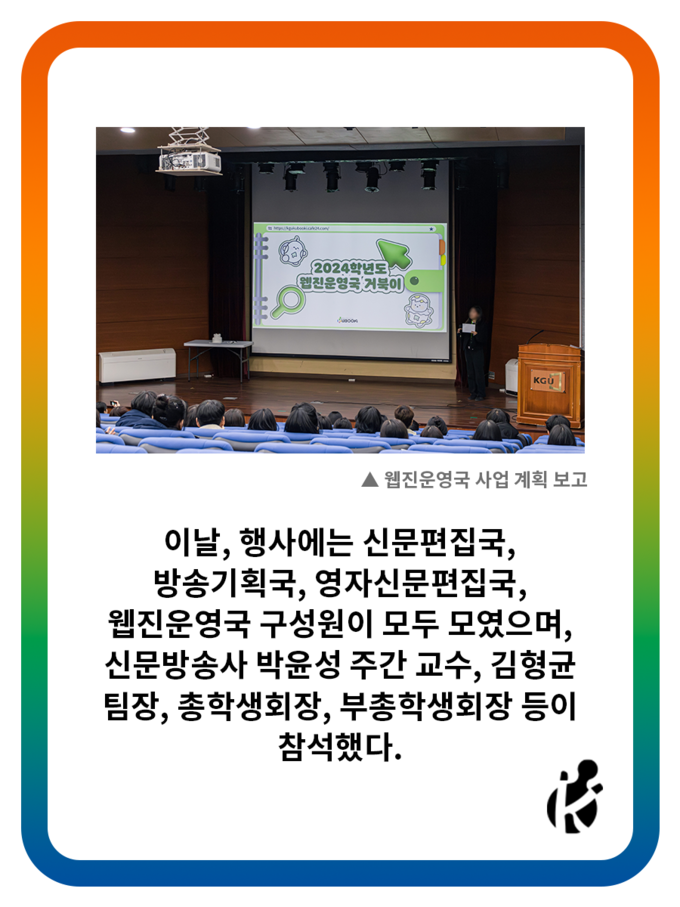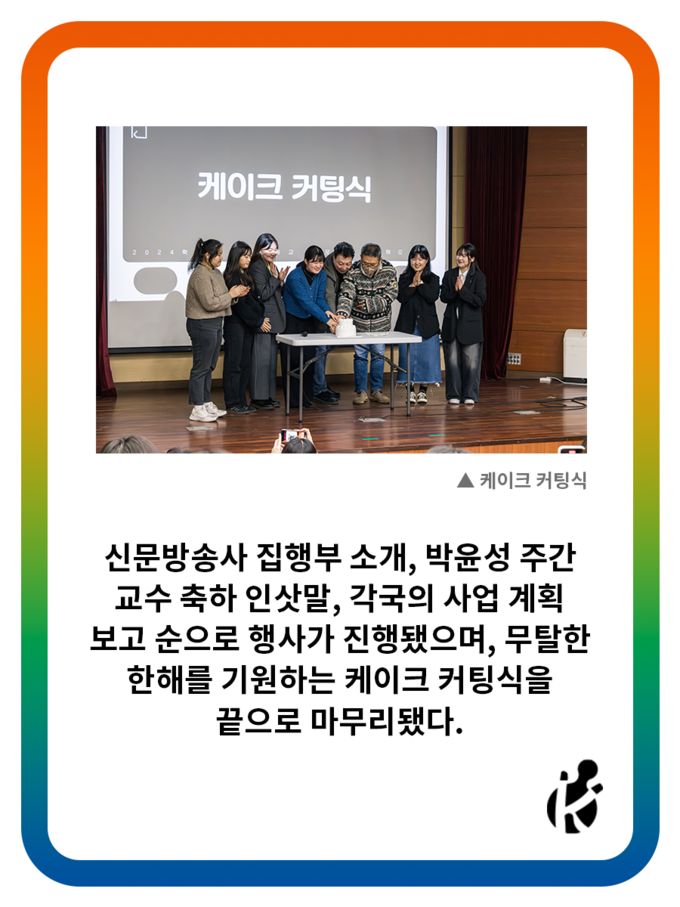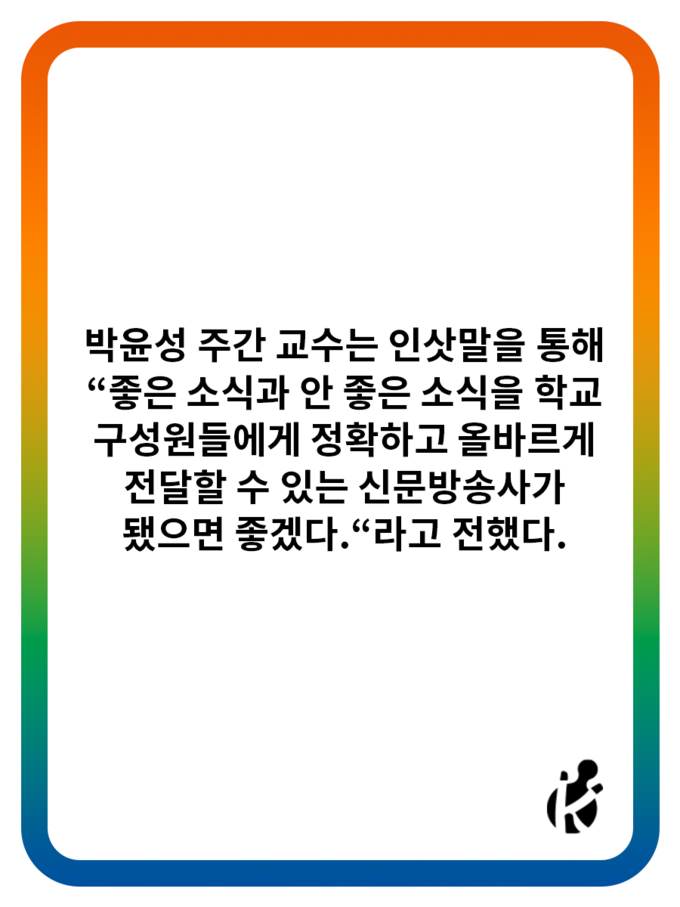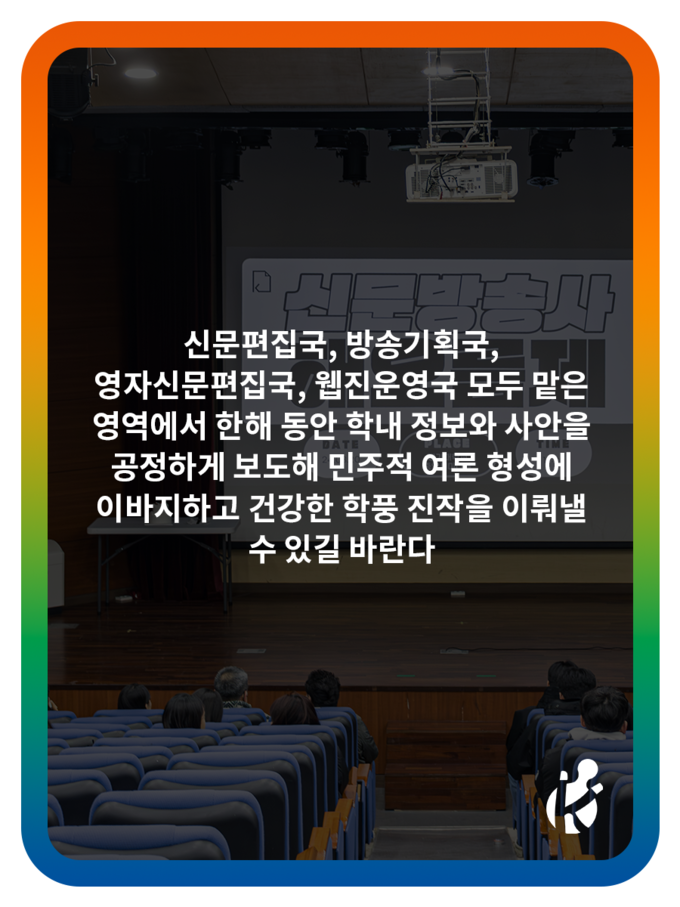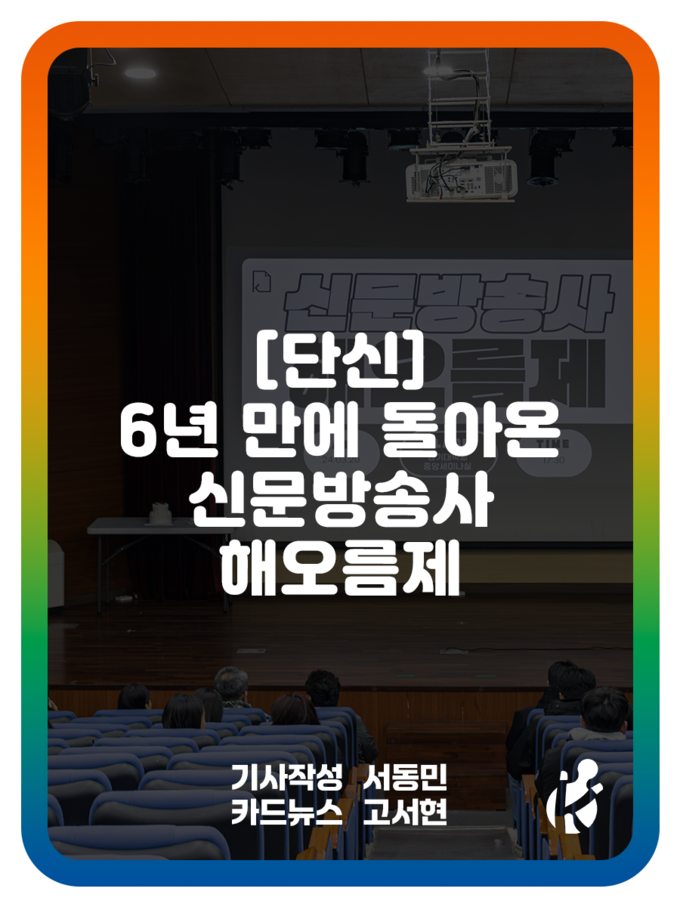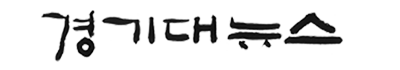내 나이 스물은 집에만 안 가면 뭘 하던 좋든 시절. 세 개의 회사에 2
년을 바치고 국가에 21개월을 헌납하고 복학, 그리고 2주 만에 이태원
에서 춤추다가 발바닥이 6조각나서 누웠다. 그 다음 주말은 기다리던
영국 록밴드 Muse의 내한 공연. 티켓을 취소하며 다짐했다. 걸을 수 있
게 되면 다시 음악을 하겠노라고.
20대가 가기 전에 ‘내 이름이 박혀있는 저작물’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
보고 싶었다. 강의도 쫓아가기 힘든 학부생이 전공서 집필은 커녕 번역
이라도 하는 것은 망상이고 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6강의동 4층을 목
발에 의지해 오르내리며 악보를 끄적였다.
대학 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며 반쯤 의무감에 가는 여행이 얼마 남
지 않은 봄의 언젠가. 나를 제외하고 전원 30대로 이루어진 밴드는 현
실의 벽에 부딪쳐 녹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찢어졌고, 돈과 시간이 남아
있던 나는 항공권을 다시 끊었다. 마지막 기말고사 날 저녁 출국해서 수강신청 전날 귀국하기로.
반신반의했다. 내가 여행에서 뭘 얻을 수 있을지. 키와 신발사이즈
사이 즈음에 위치한 토익점수는 나를 위축하게 만들었고, 지난 5년간
입시에 스펙에 밀려 못해본 취미생활 원없이 하자며 공연 보는 날이 안
보는 날보다 많은 여행계획이 세워졌고, 시험이 끝난 직후 동아리방에
서 배낭을 메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때 깨달았다. 공항은 2시간 전에만
가면 된다.
프로야구도 시작하기 전에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는 자정이 넘어서
출발했으니 6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다. 암스테르담 공항 식당에 붙어있
는 ‘한식’이라는 글자를 뒤로하며 영국으로 환승해 무박 3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락페스티벌 글래스턴베리에 입성했다. 20만 명과 함께하는 뻘
밭을 4시간 걸어 도착한 텐트에서. 여름이니 반팔만 입고 갔는데 영하의
추위에 보드카를 병나발 불며 생각했다. 해가 뜨자마자 옷부터 사야지.
다음날 아침 공연 기념후드를 입고 돌아본 세상은 참 신기했다. 히피
를 표방한 축제인 만큼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을 수출해주고 싶을 만큼 비위생적이었고 만국어 사이로 보이는 연기는 모두 다 대마였으며,
누군가 술을 권할 때마다 마약이 섞여있는지 물어봐야 했다. 일단 술만
마신 걸로 하자.
그렇게 50일 동안 술과 음악에 취해 유럽을 쏘다녔다. 에펠탑 밑에서
록을, 로마 원형극장에서 라틴음악을, 파리의 옛 감옥에서 스윙재즈를,
스위스 호수위에서 소울음악을, 켐니츠의 고궁에서 메탈을. 공연을 보
며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뮌헨에서는 체크카드에 핸드폰만 달랑 들고
가야금과 피리로 하는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테러가 두 차례나 일어났
는데 마침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관계로 테러범으로 오인 받다가 그 카드가 마침 국제학생증이라 무사히 풀려나서 지나다니는 군경을 보며 노숙했던 기억도 난다.
스위스 친구는 자기네 나라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투표로 결정하니
까 지인들과 정치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독일 친구는 공중 화장실 비누를 물 묻은 손으로 만져서 낭비하는 야만스러운 행위를 어떻게 하냐고 타박을 줬으며 프랑스 친구는 농사가 망해도 국가가 보상해
주는데 왜 날씨걱정을 하냐고 되물었다. 많은 사람들을 스쳐지나온 2달
간의 여행.
귀국하자마자 수강신청을 하고 며칠 뒤 제주도로 향했다. 에펠탑 아래에서 Muse 공연 보다가 만난 그녀와. 내 고향이라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주도가 지중해보다 훨씬 아름답다. 바람이 시원해서 혹은 둘이라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리고 개강 전날 아침, 제주도의 모 PC
방에서 록밴드 Guns N Roses의 뉴질랜드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육지로
올라오게 됐다.
올라온 다음날. 즉 개강날에 내 여행에 관심가지던 사람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그 사람은 지금 내 사장님이다. 나는 지금 여행사에서 일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 여행을 참고해서 비슷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약간의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지만 내가 전공 팀플로 전 세계의 음
악축제를 리스트업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자 프로젝트의 인수 내지는 입사를 권유했고 올해는 작년에 갔던 글래스턴베리에 가이드로 가야해서
작년과 같이 종강날 학교에서 바로 공항에 가야 한다.
일에 학교에 치여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마 싸게 간답시고 비행기를 3번 탔고 32시간쯤 탔던 것 같다. 방학에 8주 일해서 새차 뽑는다는 실업률 0% 사회의 청년과 축산업을
하고 싶다며 산 10개와 양 1000마리를 사서 방목한다는 농부를 지나 나
를 끌고 다니는 그녀의 취미생활인 반지의 제왕 촬영지 트래킹...이라고
쓰고 등산을 하러 다녔다. 커플링도 절대반지다. (전 아무런 불만도 없
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언제 다시 오겠냐며 뉴질랜드 전국일주를 하고 난 뒤
호주와 동남아를 3주쯤 스쳐지나와 귀국하고 아마 3일 뒤가 개강이었을
것이다. 그 주 주말이 기사시험이었는데 아마도 다섯 과목 중 한 과목
만 과락을 면했을 것이다. 어차피 논문은 미리 써두었기 때문에 졸업에
지장이야 없다만 응시료는 아깝네. 그 돈이면 노숙 하루 덜하고 40인실
호스텔에 묵을 수 있을텐데.
이번 학기는 전공 2개로 널널하게 다니면서 회사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다가오는 마지막 학기는 인터넷 강의 2개만 신청해두고 학교
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며 드디어 이 글을 쓰는 오늘. 벨기에에서 에티오
피아로, 남아공에서 브라질로 가는 항공편을 끊었다. 유럽에서 일도 하
고 공연도 본 뒤에 아프리카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고, 남미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이다. 대충 반년쯤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
지만 귀국하는 항공편은 끊지 않았으니 그것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박혀있는 저작물’은 여행기가 될 것 같다. 사실 그
사이에 만다린 전화번호 외우기 귀찮아서 앱 하나 만들기는 했지만 책
내준다는 회사 있을 때 열심히 써야지. 아직도 내가 여행을 왜 가는지는
모르겠다. 세상에 이유가 떡하니 있는 일이 어디 있으며, 계획대로 되는
삶이 얼마나 될까.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거지.
입학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졸업이 다가온다. 오후강의가 끝나자
마자 출근하던 시절은 어디 갔는지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컴퓨터 켤 힘
도 간당간당하다. 이력서 한 장은 빼곡하게 채워뒀지만 하고 싶었던 일
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사실 인턴이고 공모전이고
하나쯤 안 한다고 별일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휴학
을 하고 한 1년쯤 세계일주를 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킬리만자로 즈
음에서 한국인 아버님들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나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다. 이 또한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즐겁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겠지.
- TAG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1100호 축사] 경기대 역사의 寶庫 경기대신문의 1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1100호 축사] 경기대 역사의 寶庫 경기대신문의 1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진리터] 1100호가 우리의 종착지는 아니니까
[진리터] 1100호가 우리의 종착지는 아니니까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