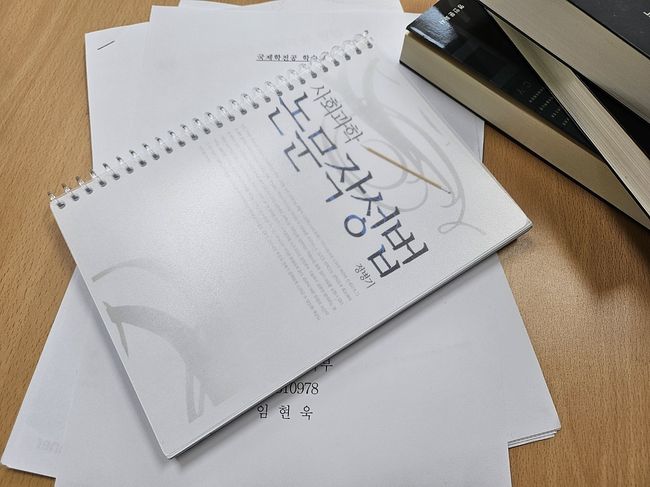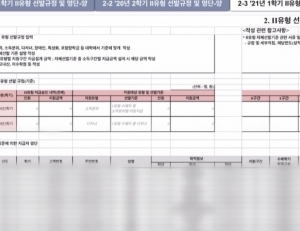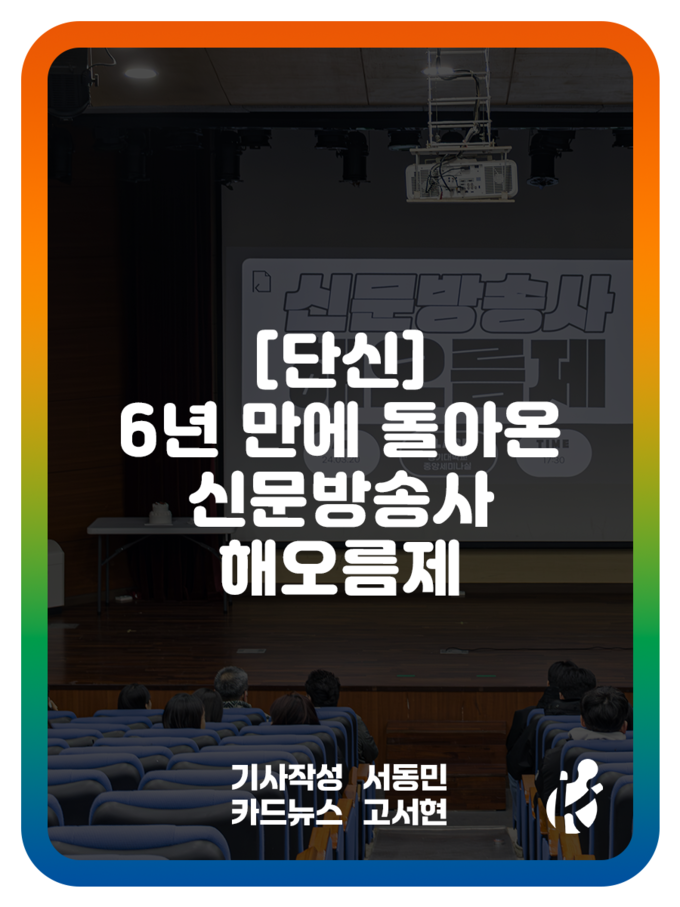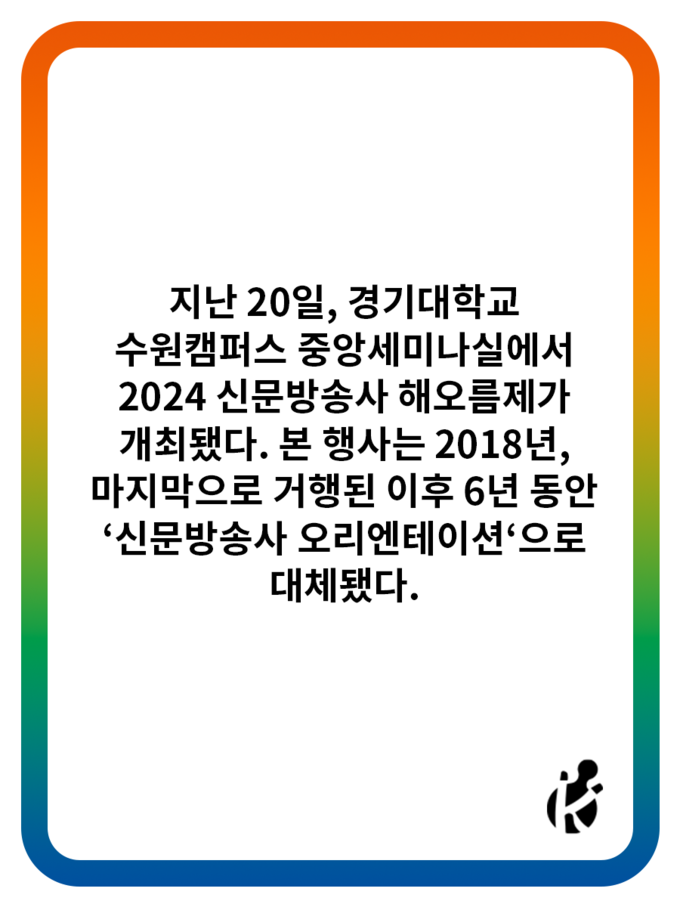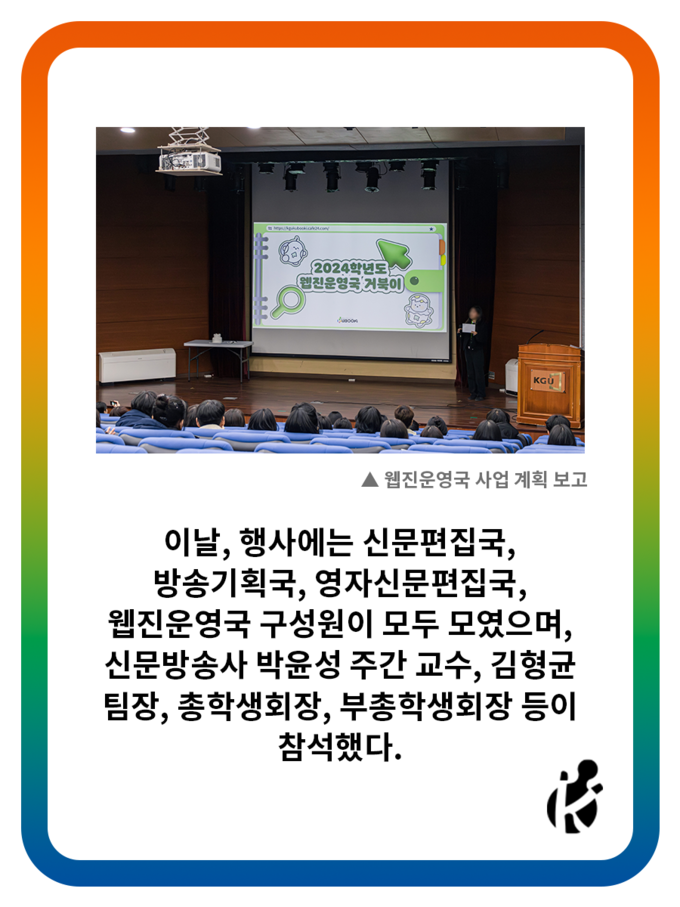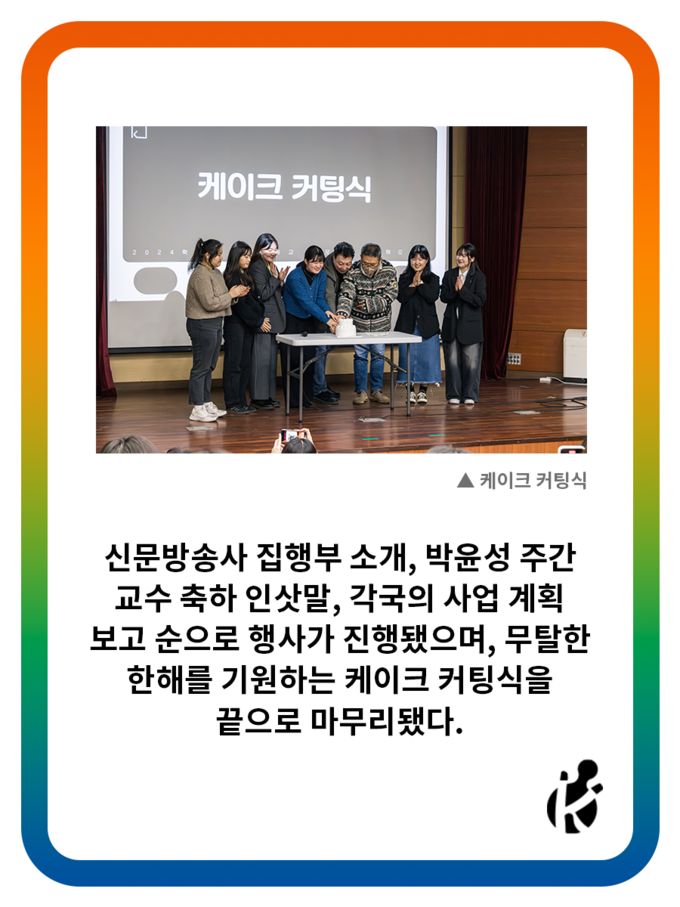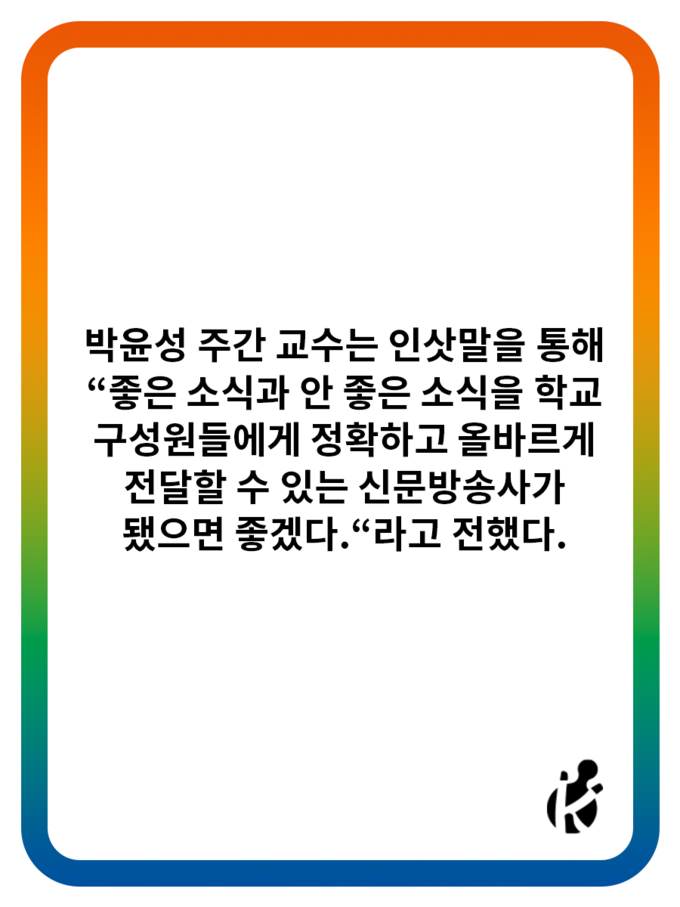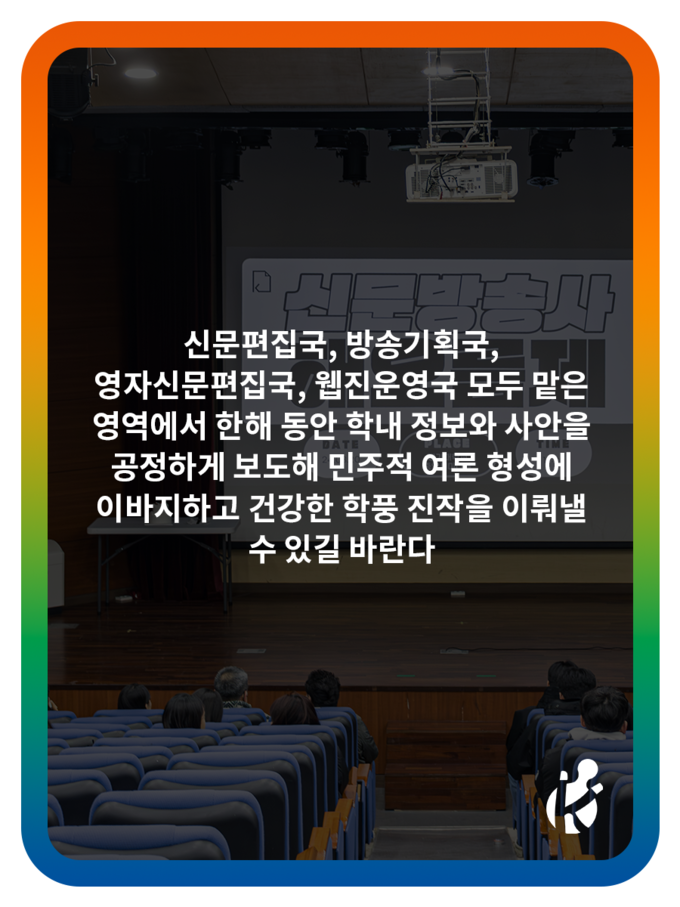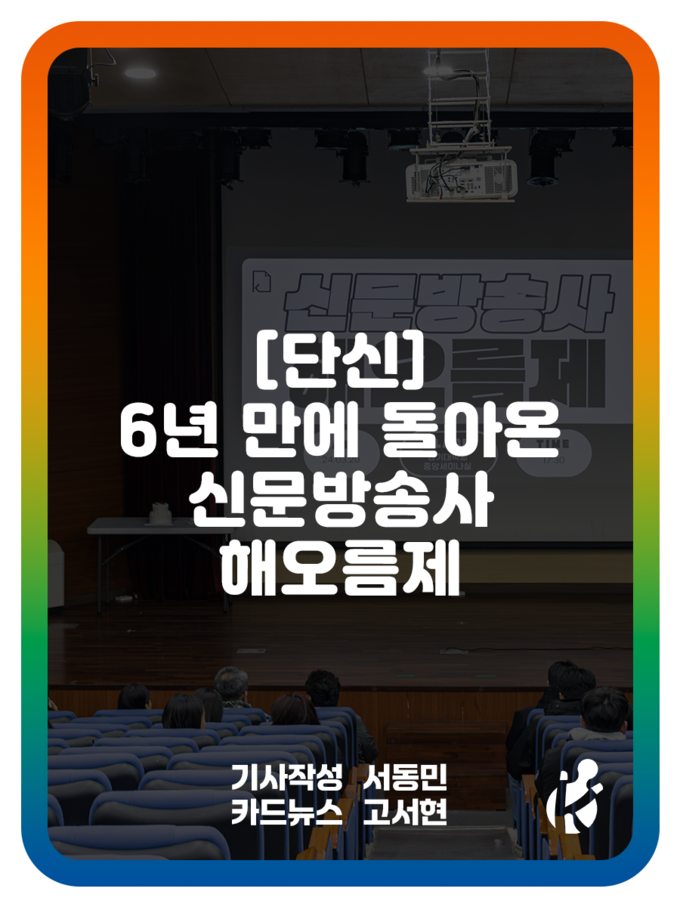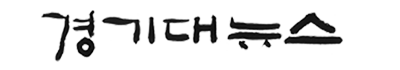기자는 본래 국제관계와 외교에 관심이 많았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공동체끼리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니, 관심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었다. 전공이 적성에 맞는 듯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술 모임,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도 하고 발표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이런 활동들은 전공 적성에 대한 기자의 생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난관에 부딪히게 했다. 바로 같은 △학교 △학과 △수업을 공유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꿈과 목표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관심사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됐다. 기자는 학교를 벗어나 전국에서 가장 드물고 희귀한 분야를 파고들려 하는 사람임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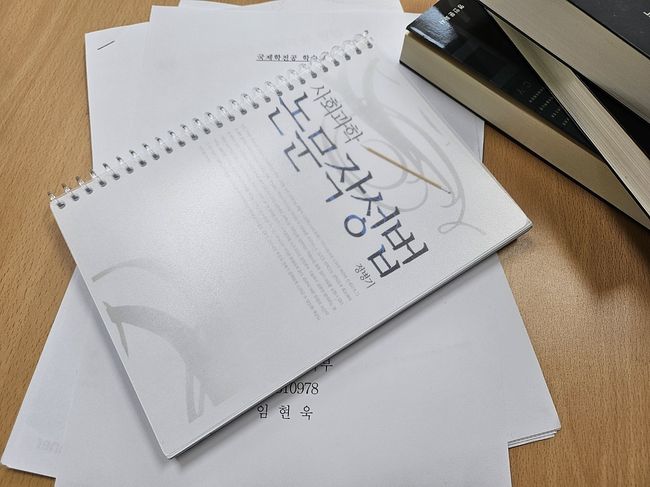
국가정보학이란 드물고 희귀한 분야를 다루며 생기는 기자의 고민은 학교생활을 하며 점점 깊어졌다. 전공의 하위 학문일지라도 교수님 중에는 어렴풋이나마 아는 교수님이 전부였고, 교내에 관련 활동은 당연히 전무했다. 과연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교수님은 계실지, 심지어는 이 학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수의 발자국은 다수의 발자국보다 쉽게 표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소수라는 특성은 타 분야와 차별성을 지니고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는데 좋은 요인이 된다. 우연한 계기로 기자가 겪은 환경을 똑같이 겪은 다른 이들과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 이들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연락하며 어려운 길을 새롭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 이제는 교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과 공통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
훗날 기자의 행동과 노력을 돌아봤을 때 발전의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할지, 혹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이유가 존재했듯 후회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질문에 역사 속 많은 이들이 남긴 수많은 어록 중 ‘어제는 어제의 논리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바탕이 돼 오늘이 이뤄진 것이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다. 불안한 전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타다 남은 장작으로 남느니 완전히 연소한 재가 낫지 않겠나 하는 확신이 든다.
글·사진 임현욱 기자 Ι 202310978lhw@kyonggi.ac.kr
- TAG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타 대학보 축사] 경기대신문의 1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 대학보 축사] 경기대신문의 1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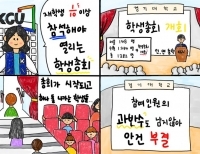 [네컷만화] 학생총회
[네컷만화] 학생총회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