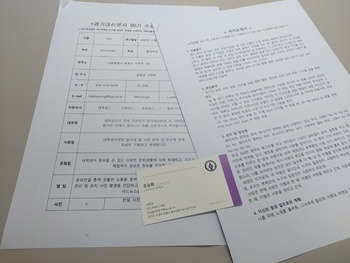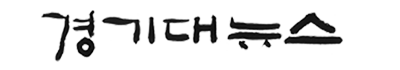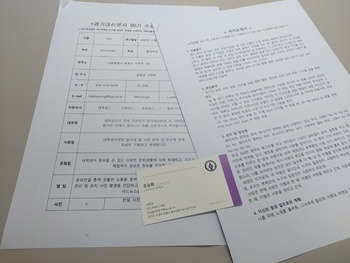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맘때, 기자는 신문사
지원을 놓고 고민하던 새내기였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기에, 대학생이 된다면 학보사에서 활
동하는 것이 개인적인 로망 중 하나였기 때문이
다. 다만 힘들다는 주변의 만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시도도 안 하느
니 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설렘과 두려움을 안은 채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았다. 당시 선배 기자들이 읽을 것을
생각해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만 몰두했던 기억이 있다. 그 덕분인지 1차 면접을 통과한 뒤 2차 면접에서도
운 좋게 최종합격해,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신문사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교 학생, 교직원 등과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쌓아가게 됐고 동시에 이별이라는 것은 기억의 한 구석에 밀려나
게 됐다.
그로부터 3학기가 지난 작년 2학기, 기자는 신문편집국을 이끌어
가야 할 운영진이 됐고 그러다 보니 새롭게 합류할 수습기자들의 면접에 들어가게 됐다. 물론 이번 학기까지 단 2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년 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던 기억이
떠올라 그때처럼 성심성의껏 면접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도
느꼈고 2년 전과 비교해 초심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수록 이별의 시간 역시 다가온다는 왠지 모를 감정의 소용돌이
에 빠져들었다.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했으나 신문사 기자로서 마지막 학기이고 수습기자 면접까
지 보니 물러날 시기, 즉 이별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돌이켜보니 신문사에 몸을 담는 동안 △선배 8명 △동기 8명 △
후배 7명을 만났고 3명의 동기와 2명의 후배를 제외한 이들과는 모두 이별했다. 인지하진 못했으나 5학기 동안의 신문사 활동 동안 아주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 것이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것
이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창밖에 부는 바람을 보는 것처럼 담담해졌다. 작은 조직인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연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굳이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문득 인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이별에는 미련 없이 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만남과 이별에 자유로운 벤치처럼.
글·사진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