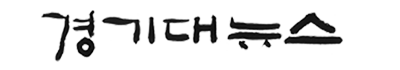‘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어렸을 땐 이 말이 맞는 줄만 알았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할 때가 있었다. 나보다 힘겨운 사람 앞에선 어리광을 부리는 사람이 될까봐, 나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앞에선 그보다 뒤쳐질까봐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달렸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오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벌써 스물하나의 시간 언저리에 있는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있었다. 친구들에게 나의 복잡한,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털어놓으면 그 무게를 혹여나 나눠주게 될까봐 혼자 삼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나만 이렇게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기준을 더 엄격히 올리고, 채찍질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위로하기보다는 독촉하고 괴롭혔다. 나의 모든 행복의 기준을 성공으로 삼고 쉬는 방법도 모른 채 걷기에만 집중했다.
그러다보니 언젠가부터 바다만큼 큰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갔다. 그 어려움들은 날 천천히,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처음 모래성을 쌓을 때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나 또한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나의 밤은 조금씩 아득해져 갔다. 나의 밤엔 달이, 그 옆엔 별도 반짝거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의 침대에 누워 미래를 한없이 예쁘게 그리기엔 돈과 시간 등 현실적인 것들이 더 커져버렸고, 꿈을 하나씩 지울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다.
성인이 되고 나와 같지만은 않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소비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을 상대할 때면 나의 모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을 이곳저곳 낭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다시 주울 수도 없던 그 감정들은 결국 마음의 쓰레기통에 가득 쌓여갔다. 누군가 먼지에 뒤엉켜 사람인지 괴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처럼, 나는 괴물로 천천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쓰레기통에 담긴 감정들을 떠안고 말이다. 그 괴물은 혹여나 자신의 몸짓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불을 맘 편히 덮지도 펴지도 못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과거의 나는 감정을 표현하고 힘듦을 털어놓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밖의 다른 것들이 뭐가 그렇게 가치있다고 나에게만 엄격했을까. 독자들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가장 소중하니, 나의 감정이 가장 우선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다. 나의 행복이 1순위니 그것을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을 멈췄으면 좋겠다. 모래성이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듯, 꿈이 사라져도 계속 꾸면 된다. 근심을 안고 온 파도는 어느 순간 멀리 떠났다가, 행복을 머금은 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걸 인정하고 그저 버티면 되는 것이다.
슬럼프가 오는 건 결과에 거의 다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슬럼프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것보다, 잘 견뎌내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 성장은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니 슬럼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고통 속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딛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슬럼프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스물하나의 어린 학생은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을 그만하기로 했다. 어두웠던 밤하늘엔 다시 별과 달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그 반짝거림은 밤을, 편안한 빛을 가진 푸른 밤으로 만들기 충분했다.
이원희
문예창작학과 2학년
- TAG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Freedom Given to Youth: An Opportunity for Choice or a Burden of Constraint?
“Are we truly free today?” Classical literature is far more than time-honored stories. It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uman nature and society that transcend time, remaining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challenges our world faces today. This article will draw on George Orwell’s 1984 and Charles Dickens’ Oliver Twist to explore the contemporary issues of youth housing and the emergence of a surveillance society ...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단신] 산악회, 본교 동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네컷만화] 라벨링 문화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진리터] 결국 우리 모두 돌아볼 것이니

 목록
목록